언젠가부터 '착하다'라는 말이 듣기 싫어졌다. 아무것도 재거나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남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렇게 바보같이 살라고 하는 말 같았다.
그러다 책 제목을 보고 "냉정한 이타주의자? 그게 가능해?"라는 궁금증에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이야기는 아니었고 개인이 사회에 기부할 때의 방법론에 대한 것이었지만 내가 갖고 있던 질문과 같은 맥락이라고 느꼈다.
생각해보면 그렇다. 우리는 아무에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기부처에는 그렇게 한다.
물론 정확히는 '아무 이유 없이'는 아니고, '분명 다른 누군가를 위해 쓰겠지'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뭘 믿고 그렇게 생각해온 거지?
내 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면서 만 원을 줬다고 뿌듯해하는 건, 다른 누군가를 위해 쓰일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어쨌든 난 착한 일을 했어'라는 자기만족에서 행위가 비롯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은 똑똑하게 착할 방법, 내 만 원의 힘을 더 키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기부의 한계효용]
한계효용이란 한 단위의 재화를 추가로 소비할 때 얻어지는 만족감으로서 많이 소비할수록 그 크기가 작아진다. 경제 전공 수업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내용이다. 예시로는 우리가 케이크를 한 조각 먹을 때와 서른 조각 먹을 때의 만족감 따위를 들고, 활용은 기업에서 노동자를 늘리는 것 등에 대해서 다룬다.
이 이야기를 전공 책 밖에서, 그것도 기부에 관련한 책에서 듣게 될 줄이야. 그래서 한 번 놀랐고, 정말 신박한 관점이라 또 놀랐다.
기부처는 소신껏 정하는 거로 생각했다.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이 걱정이면 그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의 노인층이 걱정이면 노인분들께.
이 책에서는 전 세계 단위에서 볼 때 이미 상류층인 우리나라보다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에게 기부하는 것이 '한계효용'이 크다고 말한다. 아이들이 가진 재화의 총량이 적기에 같은 금액을 쥐여줘도 더 큰 효용을 갖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분께 한 끼니를 챙겨드릴 돈이면 개발도상국에서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아이를 살릴 수 있다. 냉정하지만 맞는 말이다. '냉정한 이타주의자'라는 제목을 새삼 실감하는 대목이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또 그렇다. 정말 냉정하지만, 개발도상국의 아이를 질병으로부터 구해준다 한들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질병으로부터 나아졌을 뿐 그들은 살아가며 굶주려야 하고 교육환경도 열악하다. 그런데 선진국의 아이 한 명의 생명을 구하면 그들보다 더 높은 확률로 더 생산적인 성인으로 자랄 수 있다. GDP에 기여하는 바도 더 클 것이다. 말하면서도 죄책감이 들 만큼 냉정하지만, 냉정할 거면 끝까지 냉정해야지.
책에서도 말한다. '우리는 늘 추가되는 단위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라고.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알면서 물의 가치는 모른다는 것이다. 마찬가지이다. 선진국의 아이도 배가 고프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개발도상국의 아이 열 명보다 더 큰 가능성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이것도 책에서 나온 말이다. '긴급상황은 늘 발생한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건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이 더 심각해보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늘 긴급상황이고 춥고 배고픈 아이들이 있다.
[우리는 하나의 답만을 갖고 있을까?]
책에서는 한계효용을 거론하며 우리나라(물론 저자의 '우리나라'는 미국이겠지만 어쨌든)보단 개발도상국에 기부하는 게 더 큰 가치를 갖는다고 말했다.
처음엔 기부의 기준을 정하다니 새로웠는데 더 생각해보니 좀 이상하다. 물론 좋은 기부와 나쁜 기부의 기준을 정하는 시도는 좋았고, 필요한 일임에도 동의한다.
하지만 그의 말이 맞는다면 우리는 단 하나의 기부처만을 갖게 된다. 어딘가에 있는 '한계효용이 가장 큰 곳'.
지인이 암으로 고생해 암과 관련된 곳에 기부하는 것을 비효율적인 일로 치부하는데 왜 기부하는 사람의 효용은 생각하지 않는가? 기부하는 사람도 나의 돈에 대한 나의 효용을 따질 권리가 있다.
'이 기부처가 유명하군! 그럼 내 돈을 기부해야겠어.'라는 단순한 사고는 자신의 돈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고 비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 관련 단체에 기부하겠어.'라는 결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낮게 평가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내가 원하는 기부처를 뒤로 하는 것보다 낫다.
기부가 아니라 봉사로 가면 더욱 그렇다. 나의 마음가짐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강신청을 할 때 늘 의지에 불타오른다. '그래, 이 수업을 듣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어!' 하지만 내 흥미와 적성이 아니면 그 불은 곧 꺼진다. 봉사도 내가 원하는 곳을 선택해야 더 큰 효용을 낳는 것이다.
도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누가 그랬다. '정말 냉정할 거면 애초에 기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기부는 내 마음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분야 안에서 그 효용을 따질 수야 있겠지만, 효용이 크다고 내가 관심 없는 분야에 돈을 주고 싶지는 않다.
[기부를 위한 돈벌이]
'기부는 화염에 휩싸인 건물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처럼 눈부신 액션은 없어도 생명을 구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멋진 말이다. 기부하면서도 '이 몇 푼 가지고 기껏해야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라는 회의가 드는데 그 몇 푼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고, 화염에 휩싸이지 않고도 수치상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이 문구에서 실감했다.
그러면서 '기부를 위한 돈벌이'라는 단어를 꺼낸다. 겉으로 보기엔 의사, 소방관만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원하는 일을 하면서도 기부를 통해 그들처럼, 어쩌면 그들보다 더 많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타인을 위한 직업을 선택하지 않아도 될까?'라는 고민을 했던 나에게는 명쾌한 말이었다. 하지만 독서커뮤니티에서는 혹평을 받았는데 아마도 의사와 소방관의 수고를 간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일 것이다.
저자는 '당신이 아니었더라도 어차피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내가 의사를 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는 의사를 했을 텐데 그 자리만 채워놓고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은 개인 수준에서는 옳지만 사회 수준으로 번지면 '나 하나쯤이야'의 폐해가 벌어질 수 있다.
개인에겐 맞는 말이어도 집단에겐 틀린 말일 수 있다. 콘서트장에서 나 혼자 서서 보면 편하게 볼 수 있지만 모두가 서서 보면 아무도 편하게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그래서 독서커뮤니티와 나의 의견이 갈렸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일단은 맞지만 경계해야 하는 말' 정도로 볼 수 있겠다.
'내가 아니었더라도 어차피 이 결과가 일어났을까?'는 사실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문장을 보고 정은경 청장님이 떠올랐다.
전례 없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평정심을 잃지 않고 대처하시는 모습이 늘 존경스럽다. 그런데 이분이 없었어도 다른 누군가가 청장님만큼의 역할을 해냈을까? 모를 일이다. 청장님보다 더 잘 해냈을지, 못했을지 알 방법이 없다.
'내가 아니어도 다들 나만큼은 할 거야.'라고 지레 겁먹기보다 내 역할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
[마무리]
늘 따뜻하게 너그럽게 봐오던 기부에 대해 냉정하게 따져보는 시간이었다. 나도 이제는 똑똑하게 착하고 싶다. 도울 수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 돕는 사람보단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싶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효용을 재고 들어가기보단, 내 마음이 따르는 안에서 행동하고 싶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계산적으로 맞는다고 해서 돕는 것은 나를 위한 일도, 남을 위한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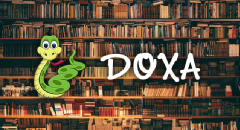
 팀장
김경환
팀장
김경환 신훈범
신훈범 고경아
고경아 한가은
한가은 이재희
이재희 송기준
송기준